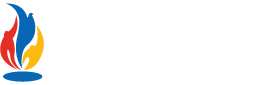[제10회/2014년/글]우수상 - 강수현(관교여중3)
아버지의 일기
관교여중 3학년 강수현
"아빠가 병원에서 무료하시 단다. 책 좀 골라오렴."
엄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아빠의 병이 다시 나빠졌기 때문이다. 아빠는 여유로우신 것 같지만, 그 점이 오히려 엄마를 초조하게 하나보다.
아빠는 '이제 죽어야지'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 이번에도 '다 내 업이다, 이제 죽어야지' 하는 통에 엄마의 호통이 이어졌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자는 말에 엄마는 거의 쓰러지다시피 했다.
짹짹대는 새소리가 창문너머 들려왔다. 사실 아빠는 조금 어색한 존재였다. 별 이유 없이 내가 커가면서 사이는 멀어졌다. 나는 서재로 들어섰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아빠는 다정했었다. 곧잘 옛날이야기를 해주셨으니 무뚝뚝한 아빠로선 피나는 노력에 틀림없다. 문득 집으려던 책 옆에 수첩이 하나 있었다. 구겨진 수첩을 꺼내 펼친 순간 이것이 아빠의 일기임을 직감했다.
1980년 5월 18일
며칠 째 신발 끈도 풀지 못하고, 전투복도 벗지 못한 채 잠을 자고 있다.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이유에서였다. 드디어 출동명령이 떨어졌다. 지금 길을 떠난다.
1980년 5월 20일
퇴각명령이 떨어졌다. 시민들은 떠나는 여단에 박수를 치며 군가를 불러주었다. 시민들은 악수를 하기도 하고 말을 걸기도 했다. 그러나 군은 다시 시위를 진압하러 올 게 뻔해 보였다.
"형, 밥은 먹었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손에 만두를 쥐어주고 미소를 지어보였다. 감사를 하기엔 뭣한 상황이라 당황한 채 바라보는데, 대열은 빠른 걸음으로 움직여 청년은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유가 무엇인지 손에 쥔 만두를 쳐다보았지만 먹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가슴 속에 그 청년의 순진한 미소가 걸렸다.
1980년 5월 21일
우리는 걸어서 광주도청에 도착했다. 실탄을 나눠받은 여단에 맞서 시위대가 몰려있었다. 긴장 속에 서로 침만 삼키고 있던 때였다. 시위대의 차량이 돌진하기 시작했다. 군인들은 몸을 피했고, 장갑차도 황급히 후진했다. 그러던 중 피하지 못한 군인이 깔렸고, 그 일병은 곧바로 죽어버렸다.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충분히 충격적이었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지휘관은 하얗게 질린 나를 도청 지하실로 들여보냈다. 그렇게 떨고 있을 바에는 안에 있으란 거였다. 광주에 도착하고서 이어진 총성과 절규, 그리고 오늘 있었던 병사의 죽음은 시위보다 전쟁에 가까워 보였다.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나눠받은 실탄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이것으로 누구를 죽여야 하는 걸까. 실탄을 멘 가슴팍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다시금 총성이 들려왔다. 너무 놀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한 중사가 들어와 말했다.
"그 놈들이 부하를 죽이 길래 막 쏴버렸다."
자랑스러운 어투였다. 순간 만두를 주었던 청년이 떠올랐다. 그도 금남로에 있을 터였다. 격양된 어조로 바깥상황을 전하는 중사는 나라가 어지러우니 우리가 지키자며 말하던 의젓했던 선임병이었다.
우리는 다시 철수 명령을 받았다. 어디로 가야하는 지도 모르고 걸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무등산이란다.
"영철아, 이 부대에 계속 있다간 사람 몇 죽어나가는 건 일도 아니게 되겠다."
동기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포로로 잡혀온 대학생을 총살했다는 얘기였다. 정말이냐며 되묻자 다른 대대의 병사가 말해준 것이라고 둘러댔다.
잠자리에서는 밤늦게 수다를 떠는 병사가 없었다. 다들 총을 가까이에 두고 잠에 들었다. 불안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었다.
1980년 5월 27일
도청 탈환 작전이 시작되었다. 도청스피커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머리가 다 아득해질 정도였다. 이윽고, 그보다 더 큰 총성이 울렸다. 모두 총구를 앞으로 들이밀고 떨리는 손에 힘을 주고 있었다.
"영철아, 나는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지."
동기가 두려워했다. 그건 모든 군사들이 마찬가지였다.
떨리는 다리를 손으로 부여잡았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곳은 전장이었다.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는 또 다른 비극인 것이다. 죽을 수도 있단 생각에 무작정 실탄을 쏴댔다. 그 총알에 누가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 모른다. 등 뒤로 애국가와 총성이 끊임없이 들렸고, 나는 도망쳤다.
낡은 수첩을 덮었다. 그 뒤의 일기는 자신이 도망쳐서는 안 되었다며 자책하는 내용이었다. 아빠의 일기는 상처의 흔적이었다.
누렇게 변한 수첩이 쉽사리 손에서 놓아지지 않았다. 마치 수첩이 30여년 전의 항쟁 그 자체라도 되는 듯이 여겨졌다. 잠시 눈을 감고 있던 나는 잠자코 고개를 숙였다. 그 시절 희생된 청춘들에게, 나의 아빠에게 바치는 묵념이었고, 상처의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묵념이었다.
고개를 들고 보니 어느새 점심 때가 멀지 않았다. 옆에 놓인 휴대전화의 진동이 울렸다. 아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