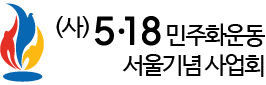몫
목동고등학교 3학년 고혜윤
"난 못가. 내 새끼 올 때 까정 있어야지. 날 놔 둬."
거동도 어려워 혼자 끼니도 해결 못하고, 앙상한 뼈마디가 겨울 나뭇가지처럼 드러난 할머니는 발버둥 치는 어린아이 같았다. 할머니가 끼니조차 혼자 해결 못해 이웃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서둘러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이제는 강제로라도 서울로 모셔오려고 아버지는 옷을 갈아입히고, 엄마는 대강 짐을 챙겼다.
할머니는 다 낡아 금방이라도 해체되어 부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장롱을 꼭 부여잡고 안 가겠다고 버티셨다. 안된다고, 장롱 문을 통째로 떼서라도 모셔갈 거라고 아버지는 완고하게 말씀하셨다. 힘겨워 보이는 저 몸으로다가 오직 손힘으로 지탱하는 저항은 조금 안타까워 보였다. 어째서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앙상하고 외로운 집에서 지내시는 걸까?
이윽고 할머니의 어깨가 축 늘어지는 것을 보았다. 장롱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던 손으로 내게 손짓 하셨다. 방관하며 지켜만 보다 임무를 맡아 다가갔다. 장롱을 열어보라신다. 장롱 문은 힘없이 열렸다. 열자마자 퀴퀴하고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났다.
"맨 아래 우리 막둥이 사진…"
아래를 더듬으니 비닐봉지 같은 감촉이 만져졌다. 끌어당겼다. 비닐봉지 안에는 낡은 사진 같은 것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막둥이? 작은 이모를 말씀하시는 거겠네 싶어 호기심에 살짝 들춰보았다. 그러나 기대했던 이모의 앳된 모습이 아니라 웬 남자가 이쪽을 보고 웃고 있었다.
"할머니, 이 사람 누구에요?"
사진을 들고 할머니께 사진을 가져다 드리며 조심스레 여쭈었다. 떨리는 손이 내 손에서 사진을 앗아갔다. 아까까지만 해도 시선 둘 곳 없이 텅 비어있던 할머니의 눈에 생기가 돌아있었다.
"누구긴 누구, 우리 막둥이지. 막둥이를 기다려야 혀."
할머니의 막둥이라면, 내 외삼촌이란 얘기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내게는 외삼촌이 없었고 가족 중 누구에게도 들은 적 없었다. 벙 찐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자 씁쓸한 얼굴을 하실 뿐이었다. 할머니의 쓸쓸한 목소리가 우는 듯 했다.
"새벽같이 나가는 막둥이를 못 가게 잡아야 했어. 총소리가 들릴 줄 누가 알았겠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윙윙대는가 싶더니 2학년 때 국사 선생님의 굵직한 음성과 모습이 다가섰다.
격동의 근대에, 광주는 고립되어 있었다.
그 날에 대해 배우던 역사시간의 교실이 유난히 고요하고 뜨거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칠판에 5월 18일을 또박또박 써내려간 선생님은 뒤를 돌아 교실을 훑어보셨다. 자리에 앉은 우리 중에는 30년이 되어가는 과거를 살았던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다. 선생님은 물으셨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어째서 일어난 일이냐, 어째서 운동이라고 불리느냐.
교과서 한 장의 다섯줄 분량에 그 질문들의 답이 압축되어 있었다. 우리는 어물어물 모범 답안을 대답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운동장 수업의 고함마저 까마득했다. 교탁 앞의 선생님은 당신의 교과서를 소리 나게 덮어버리셨다. 너네도 덮어버리라고 시키기 까지 하셨다.
"그 해에 나는 고등학생이었다. 친척 중에는 광주 사람도 없었고, 나는 서울 토종이었기 때문에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몰랐어. 나 뿐 만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은 다들 몰랐다고. 어째서? 정권을 잡은 윗분 들이 의도적으로 그 날 자체를 평온하게 꾸며버렸으니까."
그래, 그 날에 존재를 몰랐던 외삼촌, 그리고 그 시대의 뜻있는 청년들이 사그라져버렸다. 독재의 욕망과 치졸한 권위 덕택에!
"그 날의 진실을 안 것은 대학생 때였다. 몇 년이 지나고 과거가 되어버린 시점에… 그 당시 그 일을 입에 올리는 것은 '국가의 안녕을 헤치는 불온, 부정'일 뿐 이었단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모두 다 집중하고 있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시민으로서 가지는 불의에 대한 뜨거운 항쟁심이 우리를 덮었다.
선생님이 교과서 끝을 잡고 펄럭이셨다.
"지금에야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라도 짧게 쓰여 있지만, 이것도 민주화를 위해 싸워줬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다섯줄로 요악 되어버린 진실로는 조금도 변해 갈수 없다. 나머지는 이 시대 청년인 너희들의 몫이다."
그리고 수업이 끝났다. 우리들의 몫을 실감한 채로….
생각이 멎었다.
"어머니, 가셔야지요. 막내가 살아있다면 진작 왔을 거예요."
아들의 실종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할머니셨지만, 이제 그 두 눈에 체념이 들어있었다. 한 손에 낡은 사진을 꼭 쥐고 부모님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셨다. 잘못 보았을까,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흐린 눈물이 서렸다.
부축 받고 계신 할머니의 뒤를 따랐다. 그 지친 몸 위로 하늘이 펼쳐진 것을 보았다. 서글퍼질 정도로 파랬다. 그 날의 하늘은 무슨 색 이었을까…
"막둥아…"
할머니의 절규가 터지는 것을 들으며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돌아오지 못하신 외삼촌은 그 5월 18일과 같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이다.
----------------------------------------------
<돌아가신 외삼촌을 30년이 다 되어가도록 기다리신 할머니의 모습을 그렸다. 국사시간에 배웠던 우리의 몫을 떠올리게끔 했다.>
<학교 게시판에 붙어 있지 않았으면 공모전의 존재조차 몰랐을 것이다. 나에게는 간접적이로나마 5.18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 동안 역사과목을 배우며 인식해왔기에 제시된 2000자 정도를 채울 수 있었다.>